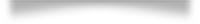“마을의 집들은 모두 대나무를 등지고 감나무가 둘러 있으며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정경이 흡사 하나의 별천지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얼마나 평온하고 정경스런 산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적어도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방곡마을을 지나면 가현마을과 오봉마을이 갈리는 두물머리다. 여기서 오봉마을은 가현교를 건너 우측 지류를 거슬러 올라야 한다. 길은 교행이 힘든 콘크리트포장도로로 계곡을 한 번 더 건너면 화림사가 나타나고, 또다시 몇 구비를 돌아나가면 비로소 이 골짜기의 마지막 마을인 오봉마을이 산중턱에서 나타난다. 지리산에서 가장 늦게 전기가 들어온 오지를 실감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산촌이다.

오봉마을 입구에 있는 각자. 노휴대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마을주민에 의하면 예전엔 “오비”라 불렀다 했으나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고, 다만 그쪽 방언에 샘을 새미, 고구마를 고매, 고동을 고디, 쭉정이를 쭉디, 궁둥이를 궁디라 부르는 걸보면 부르기 편한 그야말로 고향말쯤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오봉은 마을 주변의 다섯 봉우리, 즉 솔봉(또는 새봉), 성봉, 필봉, 매봉, 한봉에 갖혀 있는 지형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믿기지는 않지만 한때 이 골짜기엔 70여 가구가 화전과 숯가마, 인삼농사를 짓는 산골부촌이어서 덕산장과 하동장, 함양장을 넘나들던 장똘뱅이들이 새재와 외고개를 심심찮게 넘나들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사립재를 오르는 길은 오봉마을 안에서 좌측 안부를 돌아나가야 한다. 산등성이를 도는 임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곡을 건너게 된다. 그 임도의 까풀막이 끝날즈음 둘로 갈리는데 사립재는 우측으로 내려서서 다시 계곡을 건너야 한다. 예서부터는 전형적인 산길이며, 사립재에 이르기까지 계곡을 좌측에 두고 오르게 된다.
염소막을 지나 모퉁이를 돌아나가면 이 골짜기 마지막인가인 오두막이 하나 나타난다.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정말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일주일만 머물렀으면 하는 묘한 운치가 묻어나는 곳이다. 고로쇠작업 때문이었는지 사람이 머물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수돗간엔 봄기운을 받아낸 물이 철철 넘치고 있다.

오봉마을 뒤의 아지막 인가. 방 한 칸에 부억 하나로 전형적인 산골 오두막이다.
길은 너무 평이하여 특징지을만한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는 너무도 편안한 길이다. 지리산 중에서도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여럿 있지만 오늘 느낌은 장재골과 느낌이 너무 흡사하다.
계곡물 소리가 멀어진다 싶으면 너덜강지대를 지나고, 마지막 한 피치 거친 숨을 토해내고나면 바람만이 반겨주는 사립재에 올라설 수 있다. 바로 상래봉과 새봉을 잇는 능선이다.
잔설이 남아있긴 하나 신경 쓰일만큼은 아니고, 다만 예보된 비 소식에 시야를 방해하는 옅은 구름과 황사가 얄미울 뿐이다.
새봉 오르는 길은 마지막 봉우리를 올라채는 바위군 외에는 외길 날등이어서 어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다. 평소 같으면 광활한 전망을 즐길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류능선상의 향운대 구분도 쉽지가 않다. 다만 하늘금을 이루고 있는 자락 끝을 확인하여 써래봉능선과 삼봉산, 법화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왕등재습지를 안고 있는 깃대봉만이 우리가 지리산에 와있음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새봉에서 새재방향은 제법 험한 바윗길이다. 날등을 지나는 위험요소와 잔설이 있어 때론 신경을 곧추세워 길을 나아갈 때도 있지만 우회로가 많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어려움 없이 페헬리포트에 도착한다. 뒤돌아보면 여기저기 솟아오른 봉우리가 대견하고, 특히나 새봉은 둥지 안에서 먹이다툼하는 어린 새들이 부리를 치켜든 모습이어서 정겹기까지 하다.
예서부터 새재를 지나 외고개에 이르는 길은 더없이 친숙한 길이다. 지리산답지 않게 유순하기도 하거니와 인가가 가까워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같은 계절만 아니라면...
한층 낮아진 새재에서는 새재마을이 코앞이다. 고독이나 외로움에 지친 산행이나 태극종주길이라면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내려가고픈 유혹이 가장 심한 곳이다.
외고개는 지리산 주능에서 가장 낮은 고개여서 왜정시대 지도를 보면 상당히 큰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꼭 높낮이를 따져 지나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사회에서 인과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이 넘나들었던 저 고개는 차라리 정을 넘겨주는 고개가 맞을 듯하다.
남쪽으로는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한때는 자연수를 베어내어 민둥이가 된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공조림한 나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북쪽으로는 오봉리에서 올라오는 임도가 지척이다. 왕등재 습지는 전면의 상당한 깔끄막을 한 번 더 차고 올라야하며, 외고개까지 다시 오지 않고 임도로 직접 내려서는 길이 있다.
외고개에서 10여분이면 임도에 내려서고 널다란 길을 따라 한조금이면 오봉마을로 원점회귀 할 수 있다.
이 터도 이젠 도시소문이 있었는지 외지인들의 주말 즐기기에나 어울리는 건물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고 있다. 애초부터 이 땅의 주인으로 낙점받아 영원히 소유해야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이 산기슭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 들어와서 쓰라린 정이라도 어루만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더라도 긁어 부스럼이나 만들어내는 도시인들의 계산법에 또다시 편가르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산언저리에 아직도 비탄과 통곡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곳이 이곳이기에...
- 구름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