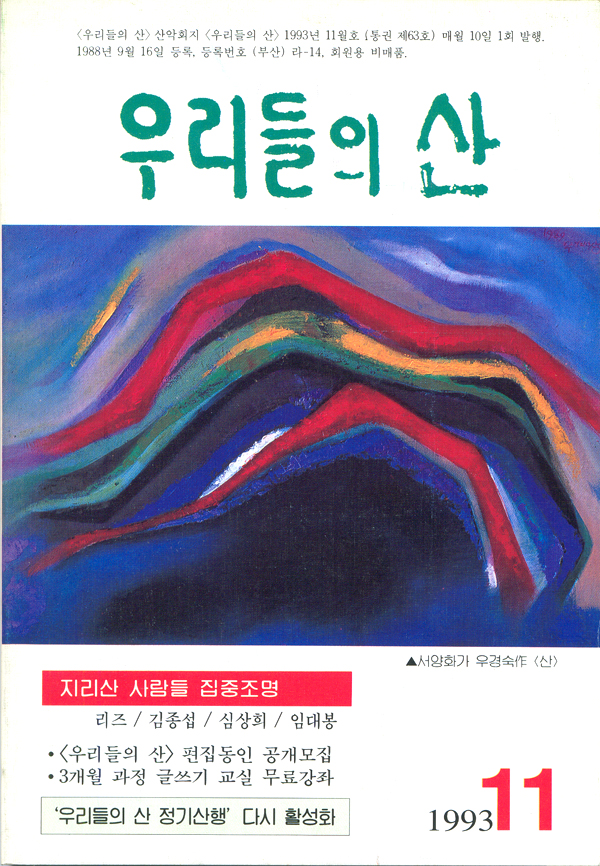
<우리들의 산> 1993년 11월호. <우리들의 산>과 끝까지 행보를 함께 했던 서양화가 우경숙님의 작품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
<우리들의 산>은 1995년을 전후하여 종언을 고했다.
<우리들의 산>을 더 이상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의 조짐을 보인 것은 1994년부터였다.
그동안 후원회원 형식으로 결속이 되어 산행을 함께 하던 이들이 ‘산우리산악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란 없는 법이다.
떨어져 나가는 이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와 논리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들의 산>에 남아있는 이들 또한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를 갖고 있었다.
<우리들의 산>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우리들의 산 르포팀’을 더욱 활성화했고, 산행도 소규모 그룹 위주로 했다.
대부분의 후원회원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더 이상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이광전, 여승익, 우경숙님 등 <우리들의 산>과 끝까지 행보를 함께 했던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도 원망할 마음이란 추호도 없었다.
무슨 일을 추진하는 데는 원래 이런저런 말들이 따르는 법이다. 시기하여 지어낸 말도 있고, 모함하는 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또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우리들의 산>은 1987년 1월호를 창간호로 펴내면서 발족이 됐다. 그러나 그 전신은 1984년에 펴낸 <山에山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후 10년에 걸쳐 이들 책을 펴내느라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 쏟아 넣은 돈도 많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또한 많았다.
책을 펴내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돈과 관련된 잡음도 적지 않았다.
그 모두가 사람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1995년을 전후하여 나에게도 중요한 신상의 변화가 있었다.
나는 국제신문 출판국에서 의뢰해온 대하르포 <지리산 1991>과 그 분책(分冊)인 <지리산> 상, 하를 펴낸데 이어 <칼러기행 설악산>과 인문지리지 <금정산의 재발견> 등 일련의 책들을 펴내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 나날이었다.
<우리들의 산>을 이제 그만 접어야 하겠다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이다.
내가 발을 빼는 것은 곧 <우리들의 산>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우리들의 산>은 통권 80여 호로 종언을 고했다.
그 사이 전국의 산악인들에게 상당한 사랑을 받기도 했던 책이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나름대로 ‘지리산 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한 셈이다.
<다큐멘터리 르포 지리산>의 김경렬, 지리산 사랑의 선구자 성산, 지리산 불일폭포의 터줏대감 변규화, 지리산 도사 성락건, 지리산 종주 챔피언 ‘자이언트’ 이광전님 등 기라성과 같은 분들의 글을 연재했던 것도 가슴 뿌듯한 일이었다.
아쉬움이 왜 없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들의 산>이 종언을 고한 것은 다른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했다면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지나친 욕심이 아니겠는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주제에 그런 책을 펴낸다는 자체가 용인받기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들의 산>, 지금 나에게는 그냥 먼 옛날의 전설처럼 생각되고는 한다.
지리산 잡지(?) [우리들의 산] (10)
by 최화수 posted Apr 20, 2010
 지리산 잡지(?) [우리들의 산] (9)
지리산 잡지(?) [우리들의 산] (9)








